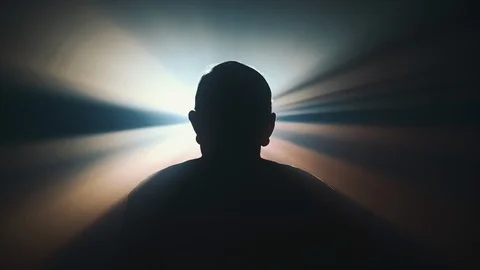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6-01-17 | 수정일 : 2026-01-17 | 조회수 : 19 |
"개발자 월 570만원 벌 때…'100만원도 못 번다'는 직업 정체" (한국경제 2026.01.16) "프리랜서 노동자 월수입·종사자 수 분석해보니 방과후 강사, 100만원도 못 번다 " "직종 간 소득격차 최대 400만원" "국내 프리랜서 노동자가 230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단순노무직, 40~50대와 20~30대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라는 말은 한때 자유를 뜻했다. 출퇴근이 없고, 상사가 없고, 스스로 시간을 설계하는 삶. 그런데 요즘 이 단어는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두 장면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한쪽에서는 월 500만 원을 넘게 버는 개발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둘 다 프리랜서다.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이건 격차라기보다 이미 다른 세계가 아닐까. 프리랜서는 더 이상 하나의 신분이 아니다.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와 기술을 갖지 못한 프리랜서는 같은 노동시장을 공유하지 않는다. 플랫폼은 말한다. “누구나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속삭인다. 아무나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다. 개발자는 일이 넘친다. 프로젝트는 이어지고, 몸값은 계속 갱신된다. 반면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할수록 더 지쳐간다. 자유는 있지만, 가격은 정해져 있고 대체는 쉽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자유라는 말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가장 편리한 언어는 아닐까. 회사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프리랜서 230만 명 시대. 이 숫자 속에는 선택한 자유도 있고, 밀려난 자유도 있다.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대안 없는 탈출에 가깝다. 이쯤 되면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왜 프리랜서를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프리랜서로 밀려나고 있는가.” 나는 이 글을 쓰며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같은 이름 아래 너무 다른 삶이 존재하는 사회는 언젠가 그 차이를 숫자가 아닌 분노로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자유의 언어로 남을지,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