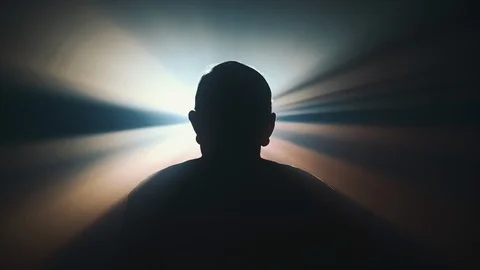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18 | 수정일 : 2025-12-18 | 조회수 : 26 |
Daily News Essay는 뉴스를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지 않고, 그 뉴스가 내 일상에 남기는 감정과 균열을 짧은 에세이로 기록합니다. 이 글은 해설도, 사설도 아닙니다. 숫자와 주장 대신, 우리가 그 뉴스를 읽으며 느꼈지만 말로 옮기지 못했던 감각에 집중합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이 뉴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서 출발해, 오늘 하루의 생각 하나를 남기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목 아파 병원 갔더니...검사 62개하고 "50만원입니다" (중앙일보 2025.12.17) -------------------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심각한 증상은 아니었고, 응급 상황도 아니었다. 그저 “혹시 몰라서”라는 마음으로 간 평범한 진료였다. 검사는 빠르게 늘어났고,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선택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치료가 아니라 계산서였다. 50만 원. 그 순간, 나는 환자가 아니라 설명받지 못한 비용의 주체가 되었다.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동의였고, 치료가 아니라 결제였다.” 의료는 불확실성을 다룬다. 신중함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신중함의 비용이 언제나 환자 개인에게만 돌아간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구조다. 과잉진료는 일부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가 윤리가 아니라 수익의 언어로 작동할 때, 검사는 안전이 아니라 매출이 된다. 환자는 선택하지 않는다. 흰 가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우리는 그 흰 가운을 지식과 윤리의 상징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싶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은 남아 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환자가 느끼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사회에서, 아픔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다. 건강은 권리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흰 가운을 믿고 싶어 한다. 그 안에 계산이 아니라 윤리와 책임이 담겨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사치처럼 느껴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사회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과 고통을 맡기고 싶다는 이 소원은 정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