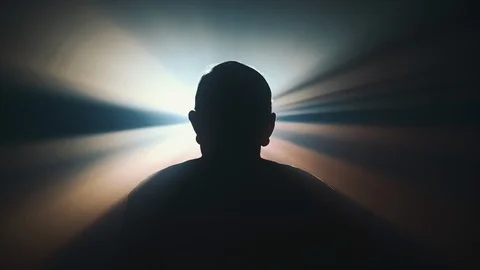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6-02-07 | 수정일 : 2026-02-07 | 조회수 : 4 |
한국 사회에서 ‘성실함’은 미덕이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착시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언어이기도 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는다. 야근을 피하지 않았고, 저축을 미덕으로 배웠으며, 불평보다는 인내를 택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성실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불안해졌을까.
최근 한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를 두고 “돈의 원리를 모른다”고 말한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저축 집착, 위험 회피 성향. 요약하면 이렇다. 열심히는 사는데, 효율적으로 살지는 못한다는 진단이다. 표면만 보면 개인의 태도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성실함은 언제부터 경제적 불리함으로 작동하게 되었을까. --------------- 「‘K-성실성’은 가스라이팅이었다… 돈의 원리를 모르는 K」 (조선일보, 2026.02.04)
여기서 의심해야 할 것은 ‘개인의 성실성’이 아니라 성실성이라는 담론이다. 첫째, 성실성은 오랫동안 도덕적 미덕으로만 다뤄졌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善)이고, 의심하거나 계산하는 태도는 이기적이라고 배웠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선택은 윤리의 문제로 치환되었다. 둘째, 이 담론은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Theory)와 맞물린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태도로 환원시키는 방식이다.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질문 대신 “네가 더 성실하지 않아서”라는 설명이 반복된다. 셋째, 그 결과 경제적 합리성의 공백이 생긴다.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고, 기회를 탐색하는 태도는 ‘요령’이나 ‘편법’으로 오해받는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경제 문해력(Economic Literacy Gap)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실성 담론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린다. 개인은 성실함을 강요받지만, 구조는 그 성실함의 대가를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다. 위험은 개인이 떠안고, 설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지된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다. “성실하라”는 말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성실함이 안전장치가 아닌 자기합리화가 된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