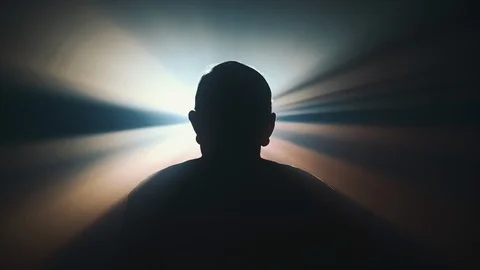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16 | 수정일 : 2025-12-16 | 조회수 : 19 |
Daily News Essay는 뉴스를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지 않고, 그 뉴스가 내 일상에 남기는 감정과 균열을 짧은 에세이로 기록합니다. 이 글은 해설도, 사설도 아닙니다. 숫자와 주장 대신, 우리가 그 뉴스를 읽으며 느꼈지만 말로 옮기지 못했던 감각에 집중합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이 뉴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서 출발해, 오늘 하루의 생각 하나를 남기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만원 열차 바닥에 앉아 과제하던 학생…英 왕실 서열 17위 공주였다 (조선일보, 2025.12.15) 英 왕실 인사들의 ‘검소한 일상’ 화제(BBC, 12월 15일) 노동의 미화, 언제 존중이 되고 언제 연출이 되는가(가디언, 12월 14일) 불평등을 바라보는 대중의 이중 기준(파이낸셜타임스, 12월 13일) --------------------------- 만원 열차 바닥에 앉아 과제를 하던 학생의 사진은 처음엔 익숙한 장면처럼 보인다. 지친 통학, 좁은 공간, 바닥에 내려앉은 몸. 우리는 곧바로 이 장면을 노력과 인내의 이야기로 읽는다. 그런데 이야기는 갑자기 뒤집힌다. 그 학생은 영국 왕실 서열 17위의 공주였다. 순간 감정이 어긋난다. 존경도, 연민도 아닌 묘한 배신감 같은 것. “그럴 필요 없잖아”라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돈다. 이 반응은 무엇을 말해줄까. 문제는 공주가 바닥에 앉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닥에 앉은 사람을 어떤 조건에서만 불쌍하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연민은 언제나 대상의 ‘배경’을 확인한 뒤에야 허락된다. 이 장면에서 노동은 노력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신분을 가늠하는 장치가 된다. 우리는 고생하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그 고생이 “불가피한 것”일 때만 진짜로 받아들인다. 선택처럼 보이는 고생은 곧바로 의미를 잃는다. 이 감각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한 구별짓기(distinction)의 현대적 변주에 가깝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바닥에 앉은 몸은 평등해 보이지만, 해석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 뉴스는 왕실 이야기라기보다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불평등을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불평등이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만 재현되길 원한다. 만원 열차 바닥에 앉은 공주는 불평등을 가린다기보다 오히려 드러낸다. 누가 고생해도 괜찮은지, 누가 고생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지. 그 기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조용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