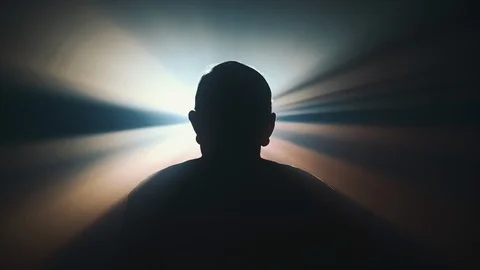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15 | 수정일 : 2025-12-15 | 조회수 : 19 |
Daily News Essay는 뉴스를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지 않고, 그 뉴스가 내 일상에 남기는 감정과 균열을 짧은 에세이로 기록합니다. 이 글은 해설도, 사설도 아닙니다. 숫자와 주장 대신, 우리가 그 뉴스를 읽으며 느꼈지만 말로 옮기지 못했던 감각에 집중합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이 뉴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서 출발해, 오늘 하루의 생각 하나를 남기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해킹 피해 반복… 보안 투자 ‘사후 대응’에 그쳐」(한국경제, 12월 14일) 「공공·민간 가리지 않는 사이버 공격 증가」(연합뉴스, 12월 13일) 「디지털 인프라는 성장했지만 안전은 뒷전」(경향신문, 12월 12일) 해킹 맛집' 돼버린 한국…왜 해킹은 일상적 재난이 됐나 (한국경제 2025.12.14) -------------------------------- 해킹 소식은 이제 놀랍지 않다. 대기업, 공공기관, 병원, 학교까지 어디가 뚫렸다는 뉴스가 반복된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또 어디야?”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위기는 반복될수록 일상처럼 느껴진다. 한국은 언제부터 ‘해킹 맛집’이 되었을까. 보안 사고는 늘어나는데, 사회 전체가 그것을 재난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사고는 수습되고, 사과문은 올라오고, 며칠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 지점에서 해킹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태도가 된다. 디지털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됐지만, 그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는 따라오지 못했다.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고, 안전은 비용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해킹은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결과가 된다.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대신, 사고 이후의 수습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보안은 항상 뒤늦는다. 이 뉴스가 불편한 이유는 피해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금융 기록, 의료 정보는 이미 일상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해킹은 화면 속 사고가 아니라, 내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묻게 된다. 왜 이렇게 자주 뚫리는가가 아니라, 왜 이 정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재난을 재난처럼 대하지 않을 때, 위험은 구조로 굳어진다. 이 장면은 위험이 제도에서 관리되지 않고 개인이 감내하도록 전가된 사회를 보여준다. (울리히 벡 Ulrich Beck이 말한 ‘리스크의 일상화’가 디지털 영역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