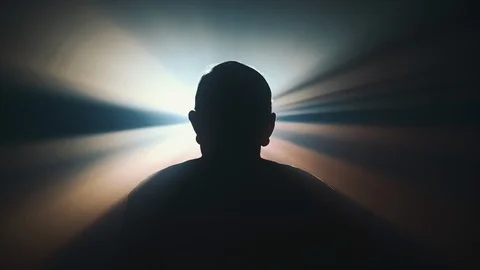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13 | 수정일 : 2025-12-13 | 조회수 : 19 |
Daily News Essay는 뉴스를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지 않고, 그 뉴스가 내 일상에 남기는 감정과 균열을 짧은 에세이로 기록합니다. 이 글은 해설도, 사설도 아닙니다. 숫자와 주장 대신, 우리가 그 뉴스를 읽으며 느꼈지만 말로 옮기지 못했던 감각에 집중합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이 뉴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서 출발해, 오늘 하루의 생각 하나를 남기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심야 상권 붕괴… 밤이 사라지는 도시들」 (경향신문, 2025.11) 「야간 경제 위축, 범죄 감소와 함께 나타나」 (서울신문, 2025.12) 「24시간 도시의 종말? 한국의 밤은 왜 짧아졌나」 (한겨레, 2025.12) ----------------- 밤이 조용하다는 말은 언제나 안심을 동반한다. 사건이 없고, 소란이 없고, 불빛이 차분하면 우리는 그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밤의 고요함이 연구 대상이 되고, 학술 논문으로 분석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고요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풍경이 아니라 관리된 상태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밤은 오랫동안 ‘안전한 일상’의 상징이었다.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해도 괜찮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덕분에 두려움이 덜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이 말하는 야간의 평온함은 범죄 감소보다 야간 활동의 축소와 더 강하게 연결된다. 사람이 줄어들면, 사건도 줄어든다. 이때 고요는 안전의 성취가 아니라 움직임이 사라진 흔적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묻지 않는다. 사람이 없는 밤과 안전한 밤은 같은 것인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은 위험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위험을 감당할 책임이 개인에게서 사라진 상태로 나타난다. 밤에 나가지 않는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도시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은 치안의 성과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덜 마주치고, 덜 우연히 만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기회를 잃는다. 안전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도시는 조금 덜 살아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이 뉴스가 불편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험 없는 도시가 아니라, 살아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밤이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정말 더 안전해진 걸까, 아니면 단지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