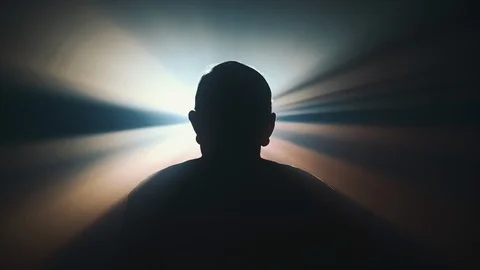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11 | 수정일 : 2025-12-11 | 조회수 : 20 |

축의금 평균이 마침내 10만원을 넘었다는 소식은 단순히 ‘돈이 더 든다’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순간 축의금 봉투는 축하의 표현이 아니라 부담의 시작, 혹은 관계가 나에게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채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마음속의 불안에 더 가깝다. 5만 원 시대가 지나고, 7만 원을 거쳐 10만 원이 된 지금 많은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한다. “축의금이 축하가 아니라 갚아야 할 카드값 같아요.” 이 감정은 결혼식 문화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MZ세대 사이에서는 조용히 ‘축의금 5만원 운동’이 번지고 있다. “부담을 줄이자”, “관계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운동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사회의 긴장을 드러낸다. 모두가 부담을 느끼지만, 아무도 그 부담의 출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채무감정(relational indebtedness)’이라 부른다. 축의금이라는 의례적 비용이 축하의 의미를 넘어 상호 채무감정을 만들어내고, 참여자들은 그 채무를 ‘적절한 금액’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느낀다. 금액은 오르지만 축하의 마음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10만 원을 넣어도 내가 부족해 보일까 봐 걱정돼요.” 이 짧은 문장은 축의금이 관계를 이어주는 장치에서, 오히려 관계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감정의 지표가 되어버렸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문제는 돈이 관계의 언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관계의 온도를 돈으로 재려는 사회에서는 돈이 올라가면 마음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금액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간극이 바로 오늘의 피로다. 그래서 축의금 10만원 시대는 단순히 물가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가 과하게 비싸진 사회의 신호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10만원이 아니라, 부담·미안함·치열한 자기관리다. 결국 질문은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 나는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의 빚을 갚고 있는가. 축의금의 금액은 오르지만— 우리가 진짜로 잃어가는 것은 가벼움이었던 인간관계의 감정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