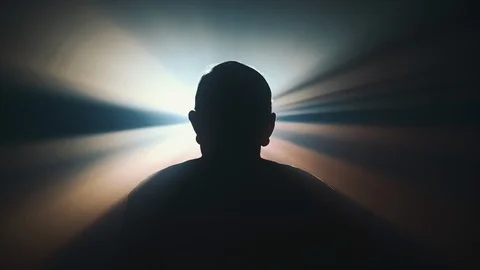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10 | 수정일 : 2025-12-10 | 조회수 : 18 |

‘다문화 국가’라는 표현은 이제 뉴스에서 너무 익숙하게 들린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말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지금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낡고, 때때로 상처가 되는 말이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오래된 언어로 타인을 설명하려는 사회의 버릇이 남아 있다. 다문화라는 말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이 말 속엔 묘한 구분이 있다. 문화가 다른 사람은 바로 ‘다문화’가 되고, 문화가 같아 보이는 사람은 ‘주류’가 된다. 이 말이 은근히 만들어내는 경계는 생각보다 깊다. 이주민은 다문화 가정이 되고, 결혼이주는 다문화 지원 대상이 된다. 마치 그들의 정체성이 “다른 문화”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회학에서는 이런 언어를 ‘차별의 프레임(frame of othering)’이라고 부른다. 단어 자체가 타인을 규정하고, 규정은 역할을 만들고, 역할은 기대와 시선을 강제한다. 다문화라는 이름은 모두를 환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너는 다른 존재”라는 구분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미 ‘단일문화’가 아니란 점이다. 학생의 10명 중 1명은 다양한 언어와 배경을 가진다. 지역의 음식점, 일터, 거리의 언어, 가족 구성까지 이미 한국은 문화가 섞인 사회가 아니라 문화가 흐르는 사회가 되었다. 흐르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가 아니라 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한 이주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 짧은 문장에서 다문화라는 단어가 놓치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다문화’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다문화 지원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를 재고하는 일이다. 용어가 바뀐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만,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논의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따라, 나 또한 어떤 세계를 살게 된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