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1-12 | 수정일 : 2026-01-12 | 조회수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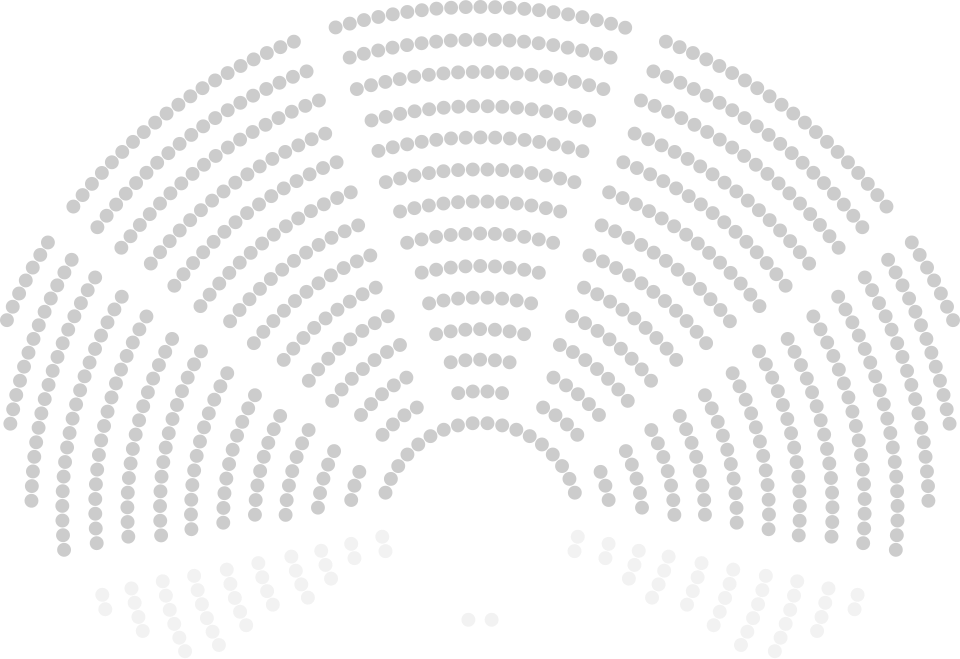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3선 구의원”···그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나 (경향신문 2026.01.11) ------------------ 이 뉴스를 읽고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웃음도 아니었고,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불쾌했다. 그리고 놀랐다. 놀랍고, 또 놀랐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런 일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버젓이 벌어진다는 점이 놀라웠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소식이 하루쯤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간다. 회의는 열리고, 표결은 진행되고, 뉴스는 다음 이슈로 넘어간다. 이 모든 것이 놀랍다. 놀랍고, 놀랍고, 또 놀랍다. 이 글은 학력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맞춤법을 비웃으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남이 써준 것을 읽는다는 사실에 있다. 그 사실 하나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의 결과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뜻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그는 발언자가 아니라 낭독자가 되고, 대표자는 주체가 아니라 전달자가 된다. 그리고 그 낭독이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 가장 불쾌하다. 이 일이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졌다면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상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부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말하는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고, 그 가능함이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그럼에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현실 앞에서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정치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 사회의 검증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작동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걸까. 더 불편한 건 이런 질문조차 금세 피로해진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금방 무뎌지고, 놀라움은 짧고, 불쾌함은 오래 남지 않는다. 그래서 더 놀랍다. 사람보다 제도가 먼저 굴러가고, 말보다 절차가 앞서고, 생각 없는 발언이 지나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가 끝난다. 이 글은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장면 앞에서 불쾌함을 느끼는 감각만은 놓치지 말고 싶다는 기록이다. 놀라운 일이 반복될수록 놀라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