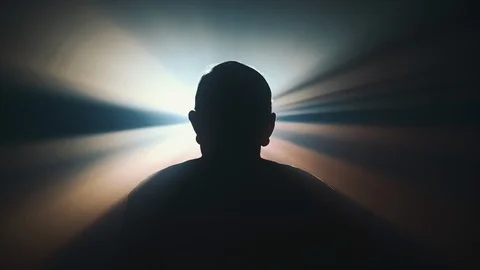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12-20 | 수정일 : 2025-12-20 | 조회수 : 20 |

기피 문구 된 ' 가족 같은 회사 ' (조선일보 2025.12.19) " 20대 후배와 가던 길에 동네 식당 출입문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다. 가족처럼 일할 사람 우대. 후배는 이 문구가 자신들 세대에게 ‘경계 대상 1호’라고 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족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돕고 지내자는 의도이겠지만, 요즘 구직자에게는 정반대로 읽힌다고 했다. " -------------------- ‘가족 같은 회사’라는 표현은 한때 따뜻한 말이었다. 서로 챙겨주고, 오래 함께 가고, 힘들 때 버텨주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구인 공고에서 가장 먼저 피하고 싶은 문구가 되었다. 왜일까. 문제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단어가 책임의 방향을 흐리기 시작했을 때다. 가족이라는 말은 헌신을 요구하지만, 보상은 모호하다. 계약 대신 정서를 앞세우고, 규칙 대신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 안에서 노동의 경계는 흐려지고, 권리는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표현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냉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가족처럼 대하겠다던 말 뒤에 돌아온 것은 구조조정이었고, 희생을 요구하던 순간의 침묵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 언어는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장치였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의 회피는 반항이 아니라 방어다. 회사가 가족을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차가운 계약을 원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관계를 원해서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언어는 신뢰의 온도를 드러낸다. ‘가족 같은 회사’가 기피 문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조직의 말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는 신호다. " 신뢰를 요구하는 언어는 언제나, 신뢰를 잃은 뒤에 등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