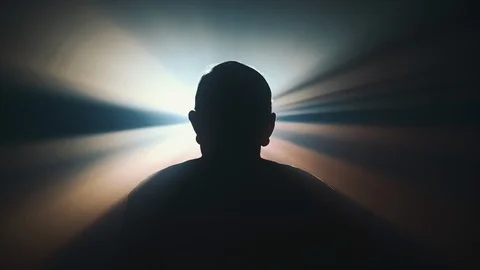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30 | 수정일 : 2025-08-30 | 조회수 : 30 |

“Social media overtakes TV as main source of news in US, analysis finds” [The Guardian, 2025-06-14]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가 TV를 제치고 주요 뉴스 소비 경로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25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뉴스 소비의 과반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AI 챗봇을 통해 뉴스를 확인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미디어 환경의 세대교체” 정도로 간단히 다루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뉴스 소비 채널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나 세대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의 권력 구조가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TV가 가졌던 ‘공동체적 경험’과 ‘중앙집중적 권위’가 사라지고, 분절된 개인화 피드가 뉴스의 주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어디서 뉴스를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적 프리즘이 필요합니다. ① 미디어 대체 이론 (Displacement Theory) - 매체 간 경쟁에서 새로운 매체는 기존 매체의 기능을 점차 대체한다는 이론입니다. 라디오가 신문을, TV가 라디오를 부분적으로 대체했던 역사처럼, 지금은 소셜 미디어가 TV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 핵심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정보 소비의 질적·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② 사용과 충족 이론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 사람들은 단순히 주어진 매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욕구(오락, 정보, 사회적 교류) 를 충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매체를 선택한다는 관점입니다. - 소셜 미디어는 TV보다 즉각적 상호작용,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사회적 연결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므로 선택됩니다. ③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 이론 (Echo Chamber & Filter Bubble) -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기존 선호를 강화하고, 다른 의견을 차단하여 편향된 정보 환경을 만듭니다. - 이는 TV 시대의 ‘공동체적 정보 경험’과 대비되어, 공론장을 파편화하고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 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단순히 “사람들이 TV보다 SNS를 더 본다”가 아닙니다. 미디어 대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매체는 단순히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매체의 역할을 흡수합니다. 이제 저녁 뉴스나 심야 토론 프로그램은 더 이상 사회적 의제 설정의 중심이 아니며, 대신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영상이나 틱톡 짧은 클립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용과 충족 이론은 이 변화를 설명합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뉴스만 골라보고, 댓글로 의견을 나누며, 자신이 속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유합니다. 이는 참여와 즉시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입니다. 그러나 에코 챔버·필터 버블 이론은 그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TV는 최소한 동일한 뉴스 경험을 사회 전체에 제공했지만, 소셜 미디어는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A 이용자는 분노의 서사를, B 이용자는 축하의 서사를 접합니다. 공론장은 쪼개지고, 사회적 합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는 민주주의와 사회 구조에 심대한 함의를 남깁니다. 첫째, 공동체적 경험의 상실입니다. TV는 특정 시간대 같은 뉴스를 보며 사회적 동시성을 형성했지만, SNS는 파편화된 시간·공간 속에서 개인화된 뉴스 경험만 제공합니다. 둘째, 정보 신뢰성 문제입니다. 전통 미디어는 사실 확인 체계가 있었지만, 소셜 미디어는 가짜 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퍼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뉴스 소비량은 늘었는데, 진실성은 오히려 약화되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셋째, 정책적 과제입니다. 이제 미디어 정책은 단순히 ‘언론 자유 보장’을 넘어, 플랫폼 책임, 알고리즘 투명성, 공공적 정보 보장 같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민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 뉴스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큐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뉴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TV를 제치고 뉴스의 주 무대가 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뉴스를 어디서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그 뉴스가 내 안에 무엇을 남기는가?” Everyday Theories [in the news]가 지향하는 이론 저널리즘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뉴스를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론의 프리즘으로 재해석해 의미와 맥락을 붙여주는 것. 그래야 정보가 지식으로, 지식이 사회적 토론으로 전환됩니다. TV에서 소셜 미디어로 권력이 이동한 지금,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정보 권력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뉴스의 통로는 바뀌었지만, 뉴스의 본질은 여전히 ‘사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