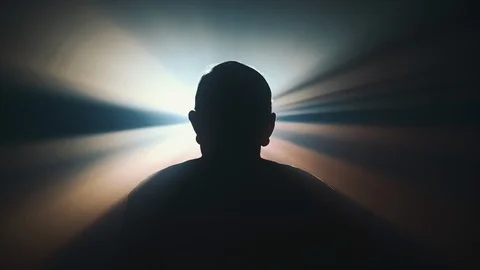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7-29 | 수정일 : 2025-07-29 | 조회수 : 82 |

Koreabizwire (2025.07.24) “More Than 560,000 Young Koreans Spend Over a Year Searching for Jobs” "15~29세 중 약 56만 명이 졸업 이후 1년 이상 구직 중, 이 중 46.6%는 3년 이상이며 평균 취업소요 기간은 11.3개월" JoongAng Daily via KEF report (2025.04) “Resurgence in long‑term unemployment hits young Koreans hard” "15~29세 구직자 중 69,000명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장기 실업자 비율이 전 연령 중 최고 (30.2%)이며, 실업이 1개월 연장될 때마다 취업 확률 1.5%p 추가 하락" ----------------------------------------------------- 한국은 지금 “청년 무의미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15~29세 MZ 세대 청년 약 56만 명이 1년 이상 구직에 실패했고, 이 중 약 23만 명은 3년 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방황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경쟁력, 사회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생산성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젊은층 소득 중단은 소비와 투자, 세대 간 형평성 모두에 치명적 영향을 끼칩니다. 청년 인적자본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식될 위험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 세수 축소, 사회 갈등 고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청년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구직 무산은 미래 산업 기반의 붕괴 신호탄이며, 체계적 개입을 지금 당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ㅇ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론 : 청년의 공백 기간은 기술·경험 → 미래소득 감소로 이어져, 인적자본 손실이 GDP 성장률 하락으로 전이 ㅇ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고용 불안과 소득 상실은 소비심리를 약화시키고, MPC가 높은 청년층 소비 감소 → 경기 악순환 ㅇ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구조적 요인 분석 실업 확대, 학력–직무불일치, 플랫폼 노동 확대 등은 구조적 고정 실업층 형성 → 사회적 사기 저하
▶ 1. 인적자본 붕괴: 시간의 경제적 손실 KEF 보고에 따르면 15~29세 장기 실업자는 약 6.9만 명이며, 구직 기간이 1개월 늘어날수록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합니다 위키백과 . 이는 곧 경험 축적 차원의 손실, 미래 생산성 저하,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용입니다. ▶ 2. 소비 둔화의 연쇄 반응 청년층 청년층의 소비 둔화는 직접적 GDP 위축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MPC가 0.8인 경우 청년층 소득 감소 100만 원은 소비 감소 80만 원 → 기업 매출감소 → 고용 축소 악순환이 확산됩니다. ▶ 3. NEET 고착화: ‘쉬었음’ 세대가 77% 최근 조사에서 19~39세 경제비활동자 중 77%가 적극 구직 포기 상태이며, 약 17%는 \'Kangaroo Tribe\'로 분류될 만큼 장기 비활동화 상황입니다 ScienceDirect Goover . 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며, 구조적 사회 불안 요소가 됩니다. ▶ 4. 교육–구직 불일치 심화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공·직업 일치도는 36.8%에 불과하며, 대졸자 과잉과 직무 능력 미스매치는 고학력 실업 확대의 주요 원인입니다
"청년이 멈추면, 국가도 멈춘다" 1. 장기 실업 문제는 청년층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경고등이다 현재 56만 명에 이르는 장기 미취업 청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징후입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실패는 단기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집니다. 청년이 장기간 직업과 단절되면 향후 소득, 세금 납부, 소비, 가족 형성, 사회적 연대의 축소로까지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률을 잠식하는 파급 효과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기부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시장 구조·교육시스템·산업정책·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책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 질’과 ‘진입 경로’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2. 일자리 창출은 고도 기술 중심 산업만이 아니라, ‘삶 가까이’에서 시작돼야 한다 청년층의 장기 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은 경험 부족, 실무 격차, 요구 스펙 미달 등의 이유로 기존 산업에서 진입 장벽을 느끼며, 초기 취업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중간 기술형·사회형·생활 밀착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 보조, 고령자 케어링, 지역 콘텐츠 산업, 교육 서비스 보조, 지속가능 도시환경 관리 등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사회적 가치도 큰 분야입니다. 3. 정책은 단기 인턴십이나 지원금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직업 연결망’ 구축으로 가야 한다 현재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 인턴’, ‘취업 장려금’, ‘청년 지원 수당’처럼 단기성·재정 의존성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 수치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고용 안정성과 경력 지속성 확보에는 미흡합니다. 정부는 이제 \'직업 연결망(Employment Navigation System)\'을 구축할 시점입니다. 이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과 성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경로로 진입해 경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산업-지역사회-정책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컨대, 지역거점 대학 졸업생이 지역 중소기업·비영리기관·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직업의 생태 경로\'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4. 청년 재교육·훈련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기술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청년 재교육은 너무도 당연한 해법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간의 간극이 크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자격증이나 코딩 과정만으로는 청년을 실무형 인재로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재교육의 핵심은 '기술적 이동성(technical mobility)'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한 ‘데이터 분석 교육’이 아니라 ‘병원 행정 데이터 분석’, ‘유통 매장 POS 데이터 분석’처럼 산업별 응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 이후 실습, 현장 경험, 취업 연계가 유기적으로 따라붙어야 합니다. 5.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층이 사회와 단절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 손실을 넘어서 공동체 신뢰 자산의 붕괴를 야기합니다. 특히 장기 실업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자기효능감의 상실은 이후 사회참여 저하, 정치 냉소, 공동체 회피로 연결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기반 약화와 정치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 통합 정책’의 일부로 청년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고립 청년 대상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디지털 복지 서비스 강화 같은 영역까지 정책적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6. 지금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장기 생애경로 설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청년 문제의 본질은 삶의 설계 가능성을 사회가 얼마나 보장해주는가에 있습니다. 불안정한 첫 직장, 반복적인 퇴사, 단절된 경력, 고립된 사회적 경험은 미래 설계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이는 곧 출산율 저하, 소비 위축,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청년의 생애 전환 단계마다 경로를 설계하고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적 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 → 취업 준비 → 초기 경력 → 직무 전환 → 지역 정착 등 단계별 정책을 세분화·개인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 기반 경로추천 시스템, 경력 진단, 중장기 멘토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화된 청년 구직 위기, 왜 지금이 '결정적 전환점'인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청년 56만 명이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구직 시장의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이 숫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고용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이들 중 약 46.6%는 3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이며,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무려 11.3개월에 달합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취업 진입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이자 경고음입니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 개인은 생산성과 경력의 단절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축소로 이어집니다. 청년들이 실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수록 기술과 경험의 누적 기회를 상실하고, 이는 미래 소득 저하, 소비 여력 감소, 전반적인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확산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인적자본 손실은 장기적으로 국가 GDP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복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 높습니다. 즉, 일정 소득이 생기면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소득이 차단되면 내수 기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이는 곧 유통, 외식, 콘텐츠, 주거 등 생활 소비재 산업 전반의 침체로 연결됩니다. 취업 실패 → 소득 감소 → 소비 축소 → 기업 수익 감소 → 추가 고용 축소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경기 하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쉬고 있음’이라는 표현이 청년 경제 활동 상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실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NEET(니트족)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시장과 점점 멀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교육·훈련조차 받지 않는 채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 붕괴와 공동체 이탈이라는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심리적 위축, 자기 효능감 상실, 사회 참여 저하로 이어지며, 민주주의 기반과 공동체 신뢰 자산까지 위협하는 비경제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결코 개인의 노력이나 ‘더 준비했어야 했다’는 차원의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구조, 교육정책, 산업 전략, 노동유연성, 사회보장체계 등 복합적 요소들이 얽힌 총체적 시스템 실패입니다. 기업은 경력직 중심의 고용을 선호하고, 교육은 시장이 원하는 실무역량을 제공하지 못하며, 정부의 청년 지원은 단기적 이벤트 중심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은 무기력하게 ‘쉬고 있음’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실업률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미래 세대가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에 다다른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부, 산업계, 교육계,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하고 즉각 행동해야 할 결정적 전환점이며, ‘청년이 멈추면 국가가 멈춘다’는 말이 더 이상 비유로만 들리지 않는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