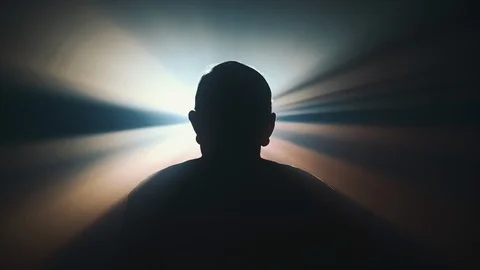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29 | 수정일 : 2025-08-29 | 조회수 : 23 |

Nature Human Behaviour, 2025-08-19: 「Social media news exposure fails to improve political knowledge」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0대~30대 뉴스 소비 경로 조사 보고서」 ----------------------------- 지하철 안, 점심시간 카페, 침대 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 그런데, 그걸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의 뉴스 소비는 대부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구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집니다. 짧고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손가락 하나로 넘겨집니다. 하지만 정작 “무슨 내용이었지?”라고 물으면, 기억나는 건 제목과 썸네일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Nature Human Behaviour에 실린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SNS에서 뉴스를 자주 소비해도, 실제 정치적 지식이나 사회 이해도는 거의 향상되지 않는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지식은 늘지 않는다. 정보는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현상을 이론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론이 말하는 ‘지식 없는 뉴스 소비’의 이유 ① 정보 과부하 이론 (Information Overload Theory) 등장 배경: 1970년대 심리학자 앨빈 토플러와 이후 디지털 시대 연구자들이 주목. 핵심 논지: 인간의 뇌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다. SNS 적용: 피드에는 수백 개의 뉴스 조각이 올라오지만, 뇌는 이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만 소비한다. 결과: 뉴스는 봤지만, 정리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증발한다. ② 주의 경제 이론 (Attention Economy Theory) 등장 배경: 1990년대 이후 디지털 마케팅과 미디어 경제학에서 발전. 핵심 논지: 현대 사회의 희소 자원은 ‘시간’이 아니라 ‘주의(attention)’다. SNS 적용: 플랫폼은 사람들의 클릭, 체류 시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다. → 그래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가 먼저 보인다. 결과: 맥락과 의미보다는 ‘클릭 유도’가 우선되며, 깊이 있는 뉴스는 사라진다. ③ 얕은 학습 이론 (Shallow Learning Theory) 등장 배경: 교육심리학과 인지과학 연구. 핵심 논지: 깊은 이해와 장기 기억은 반복, 맥락,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SNS 적용: 짧고 빠른 소비는 ‘기억에 남지 않는 정보 스낵’이 된다. 결과: 본 건 많지만, 아는 건 없다. 이 세 가지 이론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사람들의 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 ‘뉴스 본다’는 착각 속의 시민들 --- 이제 이론과 현실을 연결해봅시다. 정보 과부하는 SNS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피드에는 수십 개의 기사, 카드뉴스, 밈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를 ‘깊이 읽는’ 것이 아니라 ‘휙 넘겨보는’ 데 그칩니다. “봤다”는 착각이 남고, “이해했다”는 실체는 사라집니다. 주의 경제 이론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왜곡을 설명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뉴스는 클릭 수가 낮으면 묻혀버리고, 감정 자극적 뉴스(논란, 혐오, 연예, 분노)는 상위 노출됩니다. 정보의 질보다 반응의 양이 우선되는 구조. 얕은 학습 이론은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제는 맥락과 배경, 비교와 비판이 필요한데, SNS 뉴스는 30초~1분 안에 모든 걸 압축하려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면 --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는 시민의 판단력을 형성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 토대가 ‘얕고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로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채 투표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1. 플랫폼의 책임 강화 - 클릭 유도 알고리즘을 넘어, 공익성과 정보의 질을 반영한 뉴스 노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책임입니다. 2.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강화 - 학교, 시민 교육, 언론단체가 협력하여 “뉴스를 읽는 법”, “정보를 분석하고 맥락화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훈련입니다. 3. 이론 기반 공론장의 필요성 – [이론 리얼리즘] - 지금처럼 ‘뉴스 보고 반응하는’ 문화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 뉴스에 이론을 연결하고,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이론 저널리즘’, 즉 [in the news]와 같은 시도가 새로운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뉴스에 깊이를 주는 실험’이며,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길 중 하나입니다.
— 뉴스는 넘쳤지만, 나는 무엇을 이해했는가? ---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뉴스를 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은 막막합니다. 뉴스는 ‘정보’였지만, 그 정보가 ‘지식’이 되지 못한 채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피상적 이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주의는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깊은 이해는 맥락과 구조를 필요로 하고, 그것은 이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Everyday Theories [in the news] 같은 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해석하고, 구조로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정보가 지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쌓여야만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오늘, 뉴스를 ‘봤는가’ 아니면 ‘이해했는가’?” “내가 본 정보는, 내 안에서 지식이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