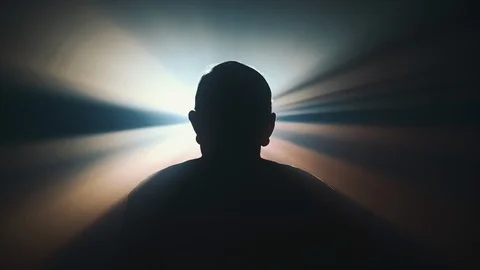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20 | 수정일 : 2025-08-20 | 조회수 : 79 |

"한국 2025년 기록적인 열대야·폭염 현상 (예: 연이은 ‘tropical nights’ 22~23일 지속)" [The Guardian, 2025.6.29] “Japan and South Korea reel from record-breaking heat” "올여름 서울 기록적 전력 수요 증가 (7월 최대 85GW, 이유: 극심한 폭염)" [Korea Joongang Daily, 2025.8.3] “Daily maximum power demand hits record high in July amid extreme heat wave” "조업, 식품 가격, 농업 피해 등 경제·생활 분야 영향 조명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Korea Times,8.15] “Intense heat waves drive up seafood prices, spotlighting need for stronger climate response” "기후 변화학적 배경: 여름은 더 길고 더 뜨겁게, 겨울은 더 짧고 혹한화되는 추세" [Wikipedia: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Historic November Snowstorm Hits Seoul [Wikipedia:2024 South Korean snowstorm] Global Warming Intensifying Extreme Events[ScienceDirect, 2025.7.22] "한국은 더 잦아진 고온·저온·극단적 기상 패턴을 경험 중이며, 장기적 기후 변화 방향을 반영" “Non-stationary temperature extremes in South Korea: An extreme value analysis of global warming impacts” ------------------------------------------------------------------------------- 과거 여름날, 농부들은 하루 종일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김을 매고, 논두렁에 앉아 시원한 냉수 몇 사발을 들이키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땀은 강물처럼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름은 원래 덥다”라며 담담하게 견뎠습니다. 겨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장터를 오가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사계절의 나라’ 한국은 늘 그렇게 순환하는 계절의 리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농부들은 하루 종일 밭에 설 수 없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과 해가 기우는 저녁 무렵 잠시 일을 하고, 한낮에는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도시의 직장인들 역시 지하철역에 몰려 휴대용 선풍기를 붙잡거나, 겨울 아침이면 북극 한파와 맞서는 듯한 복장으로 출근길을 서두릅니다. 한국의 여름과 겨울은 더 이상 ‘참을 만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의 계절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 자료(2025)'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여름철 폭염 일수는 과거 1990년대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겨울은 짧아졌지만, 간헐적으로 닥치는 한파는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외국인의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강력합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한국 여름은 동남아보다 덥고, 겨울은 유럽보다 춥다”라는 상반된 충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역시 이 변화를 주목합니다. CNN, BBC,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을 “기후 이중고 국가”라고 지칭하며, 사계절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제는 폭염과 혹한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휘청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제조업, 에너지, 보건, 교육,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를 흔드는 사회적 지각 변동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사계절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후 재난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오늘의 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기후 변화의 원인을 짚고,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해부한 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은 여름과 겨울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1. 지구 물리학적 배경: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성 기후 변화는 단순히 ‘더위가 심해졌다’, ‘겨울이 짧아졌다’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 대기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기상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불균형 이론(Energy Imbalance Theory)'으로 설명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우주로 방출해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온실가스(CO₂, 메탄, 아산화질소 등)가 방출을 가로막으면서 지구는 점점 더 많은 열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평균기온 상승(Global Warming)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마다 다른 양상의 기상이변으로 발현됩니다. 2. 한국에 집중되는 ‘이중 기후 스트레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위도에 위치해 있어, 북극권 한파와 열대권 고온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며 강력한 열돔(Heat Dome)을 형성, 장기간 폭염이 지속됨. 겨울: 북극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시베리아 한파가 남하해 단기간 강력한 한파를 유발. 즉, 한국은 “덥거나 춥거나”라는 양극단의 압박을 동시다발적으로 겪는 대표적인 기후 프런티어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과도 다른 특수성입니다. 3. 인류 활동이 불러온 가속 요인 여기에 인간의 활동이 한국 기후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뒤덮여 밤에도 식지 않는 거대한 열섬이 되었고, 폭염의 강도와 체감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패턴: 한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2024년 기준 전력의 28% 이상).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산림과 토지 이용 변화: 급격한 도시 개발과 산림 훼손은 미세기후 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국지적 폭염과 국지성 호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기후학적 이론의 적용 기후 불확실성 이론(Climate Variability Theory): 과거보다 예측이 어려운 날씨 패턴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 한국은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조차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듦. 전환비용 이론(Transition Cost Theory): 산업·에너지·도시 구조를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이 기후 위기를 늦출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줌. 한국 사회가 대응을 늦출수록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기후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충격 1. 경제: 생산성과 비용 구조의 붕괴 한국의 여름은 이제 “폭염 시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피크 수요가 78월에 집중되며, 전력 예비율은 위험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냉방 비용이 급증하고, 노동자들의 작업 효율은 2030% 이상 감소합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연간 약 5조 원 규모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대로 겨울은 짧아지고 불규칙해, 난방·의류·에너지 시장의 수요 예측이 무너집니다. 기업은 생산·재고·마케팅의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2. 보건·건강: 생존의 문제로 번진 날씨 기후 변화는 보건 문제를 단순한 ‘계절 질환’ 차원을 넘어, 공중보건 위기로 끌어올렸습니다. 폭염 사망자: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탈수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파 피해: 2024년 1월, 기습 한파로 노숙인·독거노인 사망 사례가 서울과 부산에서 잇따라 보고되었습니다. 신종 질환: 모기·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며, 말라리아·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아열대성 전염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가 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무너지는 수급 균형 기후 변화로 전력 수요의 계절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름: 에어컨 가동으로 전력 피크가 발생, 블랙아웃 위험이 매년 거론됨. 겨울: 짧지만 강력한 한파로 난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특히,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곧장 국내 전기·가스 요금으로 전가됩니다. 이는 서민 가계와 기업 운영 비용을 동시에 압박하며, ‘에너지 빈곤층’ 증가라는 사회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4. 주거·도시생활: 살기 힘든 도시의 그림자 서울·부산·대구와 같은 대도시는 이미 “폭염 생존 경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밤에도 ‘열대야’로 인해 수면 장애가 증가. 노후 아파트·단독주택 주민들은 냉방 시설 부족으로 더욱 큰 위험에 노출. 반대로 겨울에는 단열이 약한 건물에서 난방비 부담이 급등. 도시는 점차 기후 양극화를 반영하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주거의 불평등이 곧 생존의 불평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 농업: 무너지는 계절의 리듬 농업은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입니다. 벼: 고온으로 인한 쌀의 등숙 불량이 늘어나면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동시에 발생. 과일: 사과·배 등은 겨울이 짧아 휴면 기간이 줄어들면서 개화가 불안정해지고, 잦은 이상저온 피해로 농민들의 소득이 급락. 채소: 기후 불안정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며 안전성 논란이 커짐. 농촌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김을 맬 수 있었지.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쓰러져.” 이 말은 농촌 일상이 ‘기후 적응 노동’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증언입니다. 6. 레저·관광: 계절의 붕괴가 바꾼 여가 한국의 여름 관광은 이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강릉·부산 해수욕장은 한낮 피서객이 줄고, 야간 개장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스키장 업계는 겨울 시즌 단축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너무 덥다”,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라는 말이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7. 회사·교육: 일상생활의 구조적 타격 폭염·한파는 회사 생활과 교육 환경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동: 옥외 근로자들은 ‘살인적 더위’ 속에서 건설 현장을 지켜야 하며, 산재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 사무실: 냉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규제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림. 학교: 폭염으로 수업 집중도가 낮아지고, 겨울에는 돌발 한파로 등교 중지 사례가 늘어남. 즉, 기후가 일·학습·생산 구조를 잠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사계절의 나라”라는 정서로 기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폭염–혹한의 양극단을 상수로 전제하고 제도·산업·생활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문제 제시’보다 실행에 초점을 둡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보호(Protect): 생명과 기본 생활의 안전망, 전환(Transform): 에너지·도시·산업 구조의 리디자인, 공정(Justice): 취약계층과 지역 격차를 줄이는 분배. 아래 제언은 중앙정부·지자체·기업·학교·보건의료·개인까지 ‘누가, 무엇을, 언제’ 할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1) 국가·지자체: “폭염·혹한 적응 국가전략”의 상시화 1-1. 통합 경보·행동체계(Heat & Cold Action Plan) 단일 템플릿 경보: 풍속·기온·체감온도(WBGT)·시간대·권고 행동을 한 화면으로 제공(모바일·지하철·TV 실시간 동기화). 행동 메뉴 내장: “오늘 14–18시 외부활동 자제/물 250ml/20분, 고령자 전화 확인, 옥외작업 45분 작업–15분 휴식”처럼 정량·행동형 문장으로 제공. 3시간 주기 업데이트: 수치·지도·언어(한/영/중/일) 통일. 오보·가짜 영상 신속 차단 라인 구축. 1-2. 공공 인프라의 기후화 쿨링 스테이션: 도서관·지하철·체육관을 여름 ‘냉방 쉼터’, 겨울 ‘난방 쉼터’로 24시간 개방 구간화. 여름철 야간(22–06시) 집중 운영. 도시 그린 인프라: 가로수 캐노피율 30%/2030 목표, 그늘막·분무형 쿨포그·쿨페이브먼트(고반사 포장) 표준도시재생 포함. 마이크로그리드: 학교·병원·구청 단위 태양광+배터리+지능형 계량기 도입, 피크 시간대 자가전력 전환. 1-3. 법·제도 리디자인 기후작업 안전기준: WBGT 지수 기준으로 ‘작업중지권’ 법제화(옥외·고열 환경). 위반 사업장 벌점·과태료. 건축코드 개정: 신축 ‘쿨루프/고단열/차양’ 의무화, 리모델링 보조금과 대출 인센티브(저리 녹색금융). 기후적응 예산: 중앙·지자체 예산에 적응(Adaptation) 항목을 독립 라인으로 편성. “긴급대응”이 아닌 “상시투자” 전환. 2) 에너지·도시·교통: 피크와 싸우는 설계 2-1. 전력 수요관리(DR)와 요금체계 시간대별 요금(TOU) 확대: 여름 14–18시, 겨울 07–10시 요금 차등. 절감량은 포인트·현금 캐시백. 수요반응(DR): 대형마트·데이터센터·빌딩의 피크 시간대 냉방 셋팅 상향(1–2℃) 자동화, 참여 기업 인센티브. 분산형 전원: 아파트 지붕·주차장 태양광, 비상 배터리 공유. “동 단위 전력 자립률”을 KPI로. 2-2. 도심 열섬 완화 쿨루프 100만 가구 프로젝트: 반사율 0.8 이상 도료 보조, 여름 전력피크 5–8% 하향 목표. 물순환 도시(Sponge City): 투수성 포장·빗물정원·저류조로 폭우·폭염 동시 대응. 대중교통 기후화: 지하철 승강장 환기·냉방 증설, 환승센터 ‘쿨링 라운지’ 설치. 3) 산업·기업: 비용이 아닌 ‘생존 설계’로 3-1. 제조·건설 열스트레스 위험평가 정례화: 공정별 온열지수 맵핑, 교대제 조정(이른 출근·야간작업 비중 확대). 공정 효율: 고온 공정 단열·폐열 회수, 공장 지붕 쿨루프 의무화. 피크 회피생산: 전력피크 시간대 공정 대체(저전력 공정 배치)로 수요관리 수익 공유. 3-2. 유통·관광·콘텐츠 야간경제 모델: 여름 야간 개장·나이트마켓·야외 공연 시간대 재설계. 실내형 관광 다변화: 박물관·쇼핑·메디컬·웰니스 콘텐츠 묶음. 계절 리스크 분산. 체험형 리테일: 쿨링 스테이션+브랜드 팝업 연계로 ‘더위를 피할 이유’를 상업적 가치로 전환. 3-3. 거버넌스·공시 기후리스크 공시(TCFD/ISSB) 실질화: 폭염·한파 시 매출·원가·공급망 영향 시나리오 공개. 적응 KPI: 열사병 사고율·피크전력 절감률·단열 리모델링 면적 등 비재무 KPI를 임원 성과급에 반영. 4) 보건의료·복지: 생명 중심의 안전망 4-1. Heat-Health/Cold-Health Action Plan 취약계층 명부 기반 콜체크: 독거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 대상 폭염·혹한 경보 시 24시간 내 안부콜·방문. 지역 주치의–보건소 연동: 열질환·한랭질환 실시간 신고·병상 가동률 대시보드. 모바일 응급지도: 급수대·쿨링센터·야간 응급실 위치를 실시간 제공. 4-2. 에너지 복지 난방·냉방 바우처: 소득·거주형태 연동 단가, 계절별 자동지급. 냉난방기 무상 지원: 노후주택·고령층 대상 에너지효율 가전 보급(에너지공단 협력). 주거개선 패키지: 단열 창호·문풍지·에너지 진단을 묶은 원스톱 서비스. 5) 교육·노동: 시간표와 교과과정의 기후화 5-1. 학교 학사 달력 재설계: 폭염 구간(7–8월) 실내형 수업 전환, 방학·집중수업 탄력운영. 교실 미기후 관리: 환기·차양·실내 온습도 기준, 체육·야외활동 WBGT 기준 도입. 기후 리터러시: 과학·사회·보건 통합 모듈, ‘생활 속 적응’ 프로젝트 수업. 5-2. 노동 법정 휴식: 옥외·고열 노동 45/15 규칙(작업 45분–휴식 15분) 법제화, 휴게시설·얼음조끼 의무화. 재택·시차제 트리거: 폭염·한파 경보 시 자동 발동(노동부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쿨링장비·환기설비 임차비 보조. 6) 농업·식량: 품종·물·보험의 삼각 전략 작물 북상 로드맵: 벼·과수 재배지 이동 시나리오와 대체작물(고온 내성 품종, 망고·감귤 북상 등) 실증단지. 정밀 관개: 토양수분·증발산 센서 기반 관개 자동화, 가뭄·폭우 동시 대응. 농업 재보험·지수형 보험: 기온·강수 지수 기준 자동 보상으로 재해 회복력을 높임. 저온·저습 저장·콜드체인: 폭염기 농산물 손실 최소화 인프라 확충. 7) 금융·보험: 돈의 방향을 바꿔야 현실이 바뀝니다 적응채권(Resilience Bond): 지자체·공공기관의 그늘·쿨루프·배수·저류조 투자에 전용 채권 발행, 성과연동 상환. 녹색금융 인센티브: 건물 단열·고효율 냉방 투자에 금리 우대, 기후위기 대비 설비는 세액공제. 보험요율의 공정화: 기후 리스크 공개·완화 투자(예: 쿨루프, 배수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공공–민간 위험공유: 재난 초과손실 구간은 공적 재보험으로, 경미 손실은 민간보험으로 분담. 8) 데이터·커뮤니케이션: ‘정보의 품질’이 생사를 가릅니다 기후 취약지도: 동(洞) 단위로 고령인구·단열취약·녹지·의료 접근성을 중첩한 위험지도를 공개, 예산·시설 배치의 기준으로 사용. 오픈데이터 허브: 기상·의료·전력·교통 데이터를 API로 개방, 민간 서비스(경보 앱, 안부콜, 경로 최적화) 촉진. 사후평가: 폭염·한파 이후 ‘무엇이 잘 작동했고, 어디가 실패했는지’ 공개 리포트. 다음 시즌 정책 반영을 의무화. 9) 시민·가정: 일상의 체크리스트 5가지 기본: ① 물 상시 휴대, ② WBGT·체감온도 앱 구독, ③ 집의 단열·차양 점검, ④ 가족 비상연락망·만남 지점 지정, ⑤ 폭염·한파 주간에는 일정 압축·야간 대체. 주거 미세개선: 암막커튼·차열 필름·문풍지·측창 환기, 실내 선풍기+에어컨 혼합으로 소비전력 최소화. 건강 루틴: 카페인·알코올 과다 섭취 회피, 전해질 보충, 심혈관·호흡기 질환자는 경보일 의료기관 사전 상담. 10) 실행을 담보하는 KPI와 타임라인 2026년: 모든 광역자치단체 쿨링 스테이션 맵 공개, WBGT 기반 옥외작업 가이드 시범. 2027년: 신축 건물 쿨루프·차양 의무화, 학교 미기후 기준 전면 시행. 2030년: 도시 캐노피율 30%, 아파트·공공건물 쿨루프 100만 가구 달성, 여름 피크전력 8% 완화. 상시 지표: 열질환 사망률, 에너지빈곤 가구 비중, 피크전력 절감률, 응급실 체류시간, 취약계층 콜체크 이행률. 마지막 경고 – “기후와의 협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곧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적응 투자는 ‘새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손실을 선지급해 줄이는 보험’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계절적 감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생명 안전의 변수입니다. 정책결정자에게 요구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재난 대비 사회”로 언어를 바꾸십시오. 기업에게 요구합니다. 적응 KPI를 재무 성과만큼 중요하게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생활의 리듬을 기후에 맞춰 다시 짜십시오.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번 여름과 이번 겨울의 작은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정한 그늘 하나, 차양 하나, 작업 휴식 15분, 야간 개장 2시간이 내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바꾸면 삽니다. 지금 미루면, 다음 계절이 우리를 바꿉니다.

“바뀐 계절, 바뀐 삶의 조건” 기후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 자체를 흔드는, 주인공이자 심판자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 농부들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냉수 몇 사발이면 하루 종일 김을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일을 하면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기후는 사람의 체력을 바꾸었고, 노동의 시간을 바꾸었으며, 결국 삶의 질서 전체를 다시 짜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적응하면 살아남는다. 폭염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혹한으로 배관이 얼고, 전력망이 흔들리고, 농작물이 시들어가는 광경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무 한 그루의 그늘, 단열을 더한 창문 하나, 열사병을 예방한 15분의 휴식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기후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기록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사계절의 낭만을 잃더라도, 사계절의 극한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연대와 지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희망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묻습니다. 올여름, 혹은 다가올 겨울,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 답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 사회가 기후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를 직시하고 대응하는 나라로 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Climate is no longer the quiet background of our lives. It has become both the main actor and the ultimate judge. Just one generation ago, Korean farmers could work all day under the blazing sun, surviving on a few bowls of cold water. Today, the same effort could be fatal. The climate has reshaped not only our physical endurance but also our patterns of labor, rest, and survival itself. The choice before us is stark: adapt or collapse. When roads crack under heat, pipes freeze in sudden cold, power grids falter, and crops wither in the fields, these are no longer occasional news stories—they are daily reality. Yet solutions can also be surprisingly close at hand: a single tree providing shade, an insulated window saving energy, or a 15-minute break preventing heatstroke. Small acts of adaptation carry the weight of survival.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will not simply be the climate crisis itself, but the story of how we responded to it. Korea may lose the romantic image of its four seasons, but if in their place we leave behind records of solidarity, innovation, and resilience, that too will be a legacy of hope. So the final question is this: As another summer scorches and another winter chills, what will you change? Each individual choice, however small, becomes part of the collective strength that determines whether Korea remains a nation battered by climate—or one that confronts it with courage and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