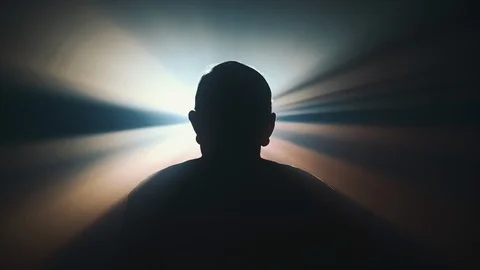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7-25 | 수정일 : 2025-07-25 | 조회수 : 44 |

Reuters (2025.07.23) "South Korea to scrutinise US‑Japan trade deal as officials fly to Washington" "한국 산업부 장관은 미국-일본 무역 딜을 주의 깊게 분석 중이라고 밝히고, 8월 1일 관세 유예 이전에 유사 조건 확보를 위해 워싱턴에서 미국과 협상 중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분야 관세 인하 협상이 핵심입니다." Reuters(2025.07.24) "South Korea minister meets US commerce secretary in effort to reach tariff deal" "한국 대표단이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하며, 일본과 유사한 조건 확보와 함께 삼성·현대차 등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고위급 인력 참여와 함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uters(2025.07.25) "South Korea officials to meet US commerce secretary again for tariff talks" "한국의 산업부 장관 및 무역대표가 주요 협의 계속 중이며, 8월 1일 관세 적용 이전 타결을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외 산업 분야의 협업 조건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The Week / Barron’s (2025.07.23) "약 What the U.S.–Japan Trade Pact Means for Everyone Else" "U.S.–Japan 무역딜은 일본산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고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이는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또는 완화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한국도 포함됩니다". ----------------------------------------------- 2025년 7월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분야의 관세 완화 및 투자 확대 조건을 조율 중입니다. 이는 일본이 체결한 U.S.–Japan 딜과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며, 수출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협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할 기회인 동시에,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노동 확대, 비정규직 증가,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 세대별·직군별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통해 경제이론의 렌즈로 무역 협상과 노동시장 변화의 관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비교우위론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데이비드 리카도의 고전적 비교우위 이론은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분야에 특화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은 이러한 분야에서 관세 인하를 통해 교역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생산보다 해외 투자 유인이 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이나 현대차가 미국에 현지 생산라인을 늘리면 국내 고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②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이론 현대 무역은 단순한 ‘수출입’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의 분절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GVC 이론에 따르면, 각 국가의 경제는 생산·조립·브랜드화 등 다양한 가치사슬에 포지셔닝됩니다. 한국의 무역협상은 이 가치사슬 내 위치를 유지하거나 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반도체 고급 공정까지 자체화한다면, 한국은 중간재 또는 기술이전의 역할로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노동시장에도 ‘저숙련 일자리’ 집중과 같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③ 노동공급 유연성 이론 (Labor Market Flexibility Theory)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면 기업은 생산기지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파견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 등 유연 고용 형태가 늘어납니다. 한국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약 35%가 비정규직이며, 플랫폼 노동자도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역 협상이 노동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형 일자리만 늘어나는 ‘일자리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④ 국제협상 이론과 전략적 협상 게임 한국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협상 이론’은 양국의 선택이 ‘게임이론적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국이 미국의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단기 이익은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주권이나 자국 산업 보호 역량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보와 교환 전략이 중요합니다.
1. 고용 전략의 선제적 전환 필요 수출 산업 중심의 고용 창출 정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무역협상은 제조업 중심 일자리를 해외로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수 기반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스타트업·헬스케어·문화콘텐츠·AI·빅데이터 등 비(非)제조 부문에서 새로운 고용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2. 청년층 노동시장 보호 장치 마련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은 청년층과 비정규직입니다. 청년 일자리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직무 기반 임금체계 도입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고부가가치 산업 내 기술 자립과 국내화 확대 이번 협상은 ‘기술 종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기적 이득보다 장기적 기술자립 가능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R&D 투자 확대, 반도체·AI 핵심 인재 양성, 공공-민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4. 가치사슬 내 위치 고도화 위한 산업 정책 단순 조립 생산이 아닌, 설계·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치사슬 상위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기업 협력 모델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국-미국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단지 수출을 위한 관세 협의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분기점이며,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전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신호로 읽혀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고용의 질, 지역 간 격차, 청년의 일자리 문제 등도 병존해왔습니다. 무역 정책은 이제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 그리고 일자리 생태계의 구조까지 포함하는 종합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